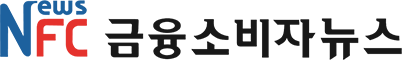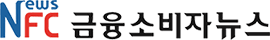"노동시간 늘리는 것보단 생산성 향상 중요...미ㆍ중간 실용외교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비주류 경제학자로서 다수의 대중 경제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로 꼽히는 장하준 런던대 교수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2008년 금융위기를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부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SVB 파산 사태에 대해 "기존의 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위기를 막은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미국·영국 등이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못하고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미봉책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응해 현재의 금융위기 징후가 다시 재현됐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1929년 대공황과 대조되는 게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1, 2차 뉴딜 정책을 하면서 금융 위기만 처리한 게 아니라 금융 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해 제도 개혁을 했다"며 "2008년 이후에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강화 말고는 이렇다 할 근본적인 개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400년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자율을 0%로, 그것도 10년 이상 유지한 적은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양적완화를 통해 엄청난 돈을 금융권에 풀었다"며 결국 시장에 자금이 넘쳐나게 됐고, 투자의 옥석 가르기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규제 조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2008년 정도의 위기로 치닫지는 않겠다면서도, 문제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 수 없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수준으로 봤을 때 생산성 제고를 고민하는 게 더욱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주 69시간 노동 등 노동시간 연장 논의에 대해 임금을 낮춰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논리로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했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며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과 관련 미·일에 쏠려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제1 교역국인 중국과 척지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실용주의 국가"라며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 같지만 "말만 그럴 뿐"이며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건 협력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